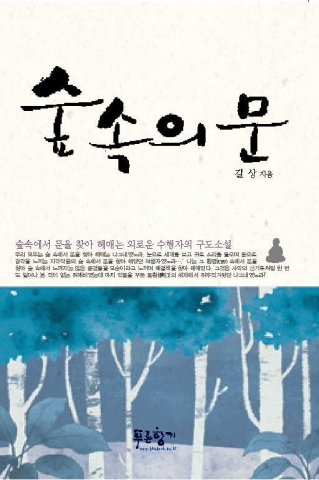
현재 수원에서 포교당을 열고 ‘삶이 곧 진리’라는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길상스님이 불교에 입문할 무렵의 방황과 험난한 구도의 길을 소설로 묶었다. 속세를 떠난 수행자의 소설이지만 저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라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절망과 방황,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유려한 문체와 깊은 혜안으로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을 한번쯤 곱씹어본 사람이라면 수행자와 범부의 차이를 뛰어넘어 저자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걸어보는 동안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 속 수많은 부처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길, 당신의 길, 우리의 길
소설 속 ‘나’는 갓 스물의 나이에 불교나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어떤 급류에 휩쓸려가듯 어떤 에너지에 이끌려 영주 부석사로 향한다. 이후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전국 각지의 사찰을 돌며 스승과 도반스님들을 만나며 진리의 문에 다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인지 체험한다. 빛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어떤 답도 얻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둡고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나’의 모습은 삶과 죽음의 문제와 모순 속에서 길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모습 그대로를 그려낸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길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이며 속세에서 산문으로, 산문에서 속세를 오가며 삶의 모순을 풀어나가려 발버둥치는 구도자의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의 자화상인 것이다.
놓칠 수 없는 재미와 감동, 스님이 쓴 소설 맞아?
소설 속에는 전국 유명 사찰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고 되살아난 고승들을 가까이 만나는 재미가 있다. 특히 선방에서 스님네들이 풀어놓는 구수한 이야기보따리와 세속의 아버지와의 애틋한 상봉, 도반 스님들과의 우정과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을 예리한 심리묘사와 아름답고 탁월한 문장으로 다루는 솜씨는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까지 독자에게 삶의 지혜는 물론 재미와 감동을 선물할 것이다.
<저자 소개>
어린 시절을 바다에서 뛰어놀며 파도의 광기와 바다의 고요를 체험하며 성장하다. 바다가 의식의 투영임을 어렴풋이 느꼈을 무렵 세상의 경쟁적 삶을 버리고 입산 출가하다. 한반도의 산하를 구름과 물처럼 떠돌다가 선(禪)의 세계에 눈을 뜨다. 삶의 모순에 갈등과 의문을 느끼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문화와 교포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명상모임을 이끌며 포교생활을 하다. 지금은 수원에서 도심 포교당을 열고 신도 도반들과 ‘삶이 곧 진리’라는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본문 속으로>
“불성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동안 답답했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야가, 지금 뭐라카노, 제 눈을 지가 어떻게 본단 말이꼬?”
노스님은 핀잔을 주듯 반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멍청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자 다시 노스님의 말이 이어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너는 너 눈을 너가 볼 수 있나?”
“행자야,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잎이 겨울에 필 수 없듯이 너 자신이 지금 혹독한 겨울 추위를 맛보아야 한다면 그 겨울이 너에게는 가장 좋은 때인 것이다. 그 때가 너를 성숙시켜줄 것이니 저항하지 마라. 그 때는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때가 오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길은 끝이 없었다.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어제는 구름이 끼더니 오늘은 비가 내렸다. 또다시 하늘은 비를 내리고 다시 맑았다. 의식은 하늘의 뜬구름처럼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으로 변하고 있었다. 정처 없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해안선을 따라 걷다가 해가 떨어지면 비린내 나는 허술한 어촌의 외딴집에서 하룻밤 유숙할 곳을 청했다. 산과 바다, 어촌과 산간벽지 촌락, 발걸음은 해가 저무는 곳에서 멈췄다. 해가 떠오르면 정처 없는 발걸음은 또다시 걷기를 반복했다. 40여 개도 넘는 암자들에서 머물기를 반복하면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땀에 젖은 옷을 벗어 빨래를 하고 저녁이면 홀로 법당에 불을 밝혔다. 주인도 없는 빈 법당에 홀로 앉아 좌선을 하고 있으면 몸과 의식은 홀가분한 듯 자유로웠지만 의식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깊은 슬픔은 지울 수가 없었다.
이해 속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를 감싸는 곳에 진리는 존재한다.
잠결에 듣게 되는 설해목(雪害木) 쓰러지는 소리에 놀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아스라이 귓전에 들려왔다. 잠결에 듣게 되는 소리들은 고달픈 소리였지만 맑고 투명해서 여운이 길었다. 겨울 산이 지닌 적막감은 나를 아득한 세계로 몰고 가는 것 같았다. 길이라는 길은 모두 막혀버렸다. 산사는 고립무원의 적막강산으로 변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글거리며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의 화염 속을 지켜보고 있으면 금세라도 의식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온갖 번뇌 망상의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럴 때면 이글거리며 타들어가는 파란 불꽃의 화염 속으로 몸을 던져 뛰어들고 싶었다. 제 몸을 태워 하얀 재로 사그라지는 장작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연소시켜 육신과 상념의 모든 찌꺼기들을 남김없이 저 우주의 심연 속으로 날려버리고 싶었다.
<차례>
제1장 출가, 미지의 세계 영주 부석사로
제2장 혼돈과 방황
제3장 제주도의 바람이 되어
제4장 그리움의 종소리
제5장 수행의 열기가 넘치는 곳, 희양산 봉암사
제6장 회상, 유년의 기억
제7장 모순, 슬픔의 땅
제8장 자각, 환영(幻影)을 넘어서
제9장 숲 속의 문
홍귀희 기자
jaa4727@hanmail.net

